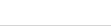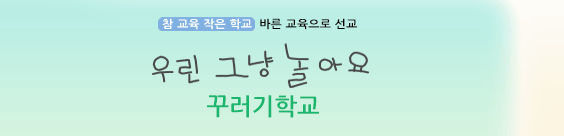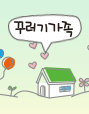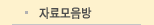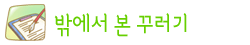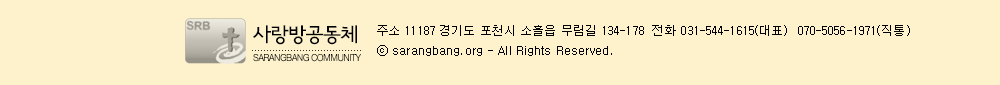자유로움 속에 싹트는 어린 상상력 (한겨례신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랑방 작성일08-03-26 18:15 조회1,51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자유로움속에싹트는어린상상력
취학전어린이대상현장ㆍ체험학습다양...“아이들 의견이 먼저”
“잡아라! 경찰이다! 손들엇! 탕탕!”
아이들의 경찰놀이는 이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경찰은 ‘총을 들고 범인을 잡는다’는 식의사고가 뿌리박혀 있는 탓이다. 서울 종로구 인의동 50-2에 자리잡은 ‘꾸러기학교’ 아이들은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동대문 경찰서를 방문해 수많은 경찰의 모습을 보여줬다.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이런 ‘현장학습’은 알게 모르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심어 놓은 편견을 깨보자는 뜻에서 만든 것이다. 소방서와 군대도 가봤다. ‘정치인은 싸움꾼’으로 알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다음주엔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다.
취학전 아이들에게 종일반으로 운영되는 꾸러기학교는 92년 4월 사랑방교회 안에서 만들어졌다. 처음부터 대안교육을 염두에 뒀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라줬으면”하는 소박한 바람에서 출발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사는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었다.
처음 학부모의 눈엔 아이들이 그저 노는 것처럼 비쳐졌다 . 한글이나 산수를 가르치는 시간도 따로 없었다. 아이가 책을 읽고 있으면, 교사가 곁에 다가가 자연스레 함께 책을 읽으며 가르치는 식이었다. 불만이 쌓여갔고, 일부 학부모들은 다른 유치원을 찾아 떠났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어머니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었다. 포천ㆍ원당 등 먼곳에서 아이들을 보내는 엄마도 있다.
15명의 아이들은 월 화 목 금요일 등 1주일에 4번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함께 지낸다. 강사5명이 요일마다 음악, 미술, 과학, 영어, 종이접기 놀이등 재능교육을 맡는다. 그순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아이들의 의견이 먼접니다. 부모나 교사는 나중이예요.” 3명의 교사 가운데 한명인 홍원숙(33)씨의 말이다.
경쾌한 ‘코끼리 행진곡’이 수업시작을 알리면, 아이들이 한 곳에 모인다. 수업이라고 해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게 아니다. 음악에 맞는 율동을 아이들 스스로 만들도록 도와준다. 무엇을 그리라고 지시하지도 않는다. 재료를 주고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게 할 뿐이다. 아이들의 상상력은 끝이 없다. 풍선을 든 도깨비 배속에 꽃을 그린 아이도 있다. 봄바람에 날린 꽃씨가 도깨비 입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놀이를 하고 나면 아이들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는다. ‘몸 굴리기’ ‘인간 피라미드 쌓기’ 등 서로 신체를 맞대는 공동놀이 탓이다. 피라미드 쌓기를 처음할 때 아이들은 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서로 다퉜다. 하지만 곧 나이가 많거나 힘이 센 순서로 피라미드를 쌓는다. 함께 사는 법을 배운 것이다. “아이들의 노는 모습에서 자주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발견합니다. 아이들이 반면 교사인 셈이죠.” 이월영(45) 교장의 말이다.
1달에 1번은 요리를 만든다. 최근엔 김장을 담그기도 했다. “저도 이게 김장담글 줄 알아요.” 리나(7)의 자랑이다. 해마다 여름과 겨울에 열리는 공동체학교는 자연과 호흡하는 시간이다. 지난 12˜5일 강원도 홍천에서 아이들은 눈썰매를 만들어 타고, 연을 만들어 날렸다. 저녁엔 고구마 감자를 구어 먹고, 스스로 대본을 지어 연극도 했다.
꾸러기학교의 공식적인 교육비는 없다. 학교설립 산파구실을 했던 사랑방교회에 헌금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사랑방교회는 학교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오는 4월엔 사랑방교회를 따라 경기도 포천으로 이사한다. 꿈꾸던 운동장도 생긴다. 사정상 제한했던 아이들 수도 2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 인터뷰 / 이월영 교장
엄마 교사역할 두몫 “힘들지만 즐거워요”
교사를 겸하고 있는 이월영(45) 교장은 ‘교장’으로 불리는 것에 익숙지 못하다/ 아이들은 ‘사모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엄마처럼 여기고 따른다.
꾸러기학교는 이씨에게 그 의미가 사뭇 남다르다. 89년 13살 된 아들을 사고로 잃어버린 아픔을 딪고 일어서게 해준 것이 이 학교다. 처음엔 교사가 안되려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씨는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됐다. “꾸러기 학교 아이들 모두가 내 자식이죠.” 사모 노릇을 하랴, 교사 노릇을 하랴, 이씨에겐 이중의 부담이다. 하루종일 아이들과 지내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말할 기운조차 없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지요. 하지만 아침에 아이들이 놀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인천교대를 나와 2년반 교사생활을 했던 이씨가 ”교사 기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며 하는 말이다.
아이들을 데리고 교외로 등산 갔을 때 꾸러기학교에 대한 설명을 들은 한 퇴직교수의 말을 이씨는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선생님 끝까지 힘내세요. 우리 교육이 바뀔 날이 곧 올 겁니다.”
(조준상기자) -한겨레신문
취학전어린이대상현장ㆍ체험학습다양...“아이들 의견이 먼저”
“잡아라! 경찰이다! 손들엇! 탕탕!”
아이들의 경찰놀이는 이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경찰은 ‘총을 들고 범인을 잡는다’는 식의사고가 뿌리박혀 있는 탓이다. 서울 종로구 인의동 50-2에 자리잡은 ‘꾸러기학교’ 아이들은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동대문 경찰서를 방문해 수많은 경찰의 모습을 보여줬다.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이런 ‘현장학습’은 알게 모르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심어 놓은 편견을 깨보자는 뜻에서 만든 것이다. 소방서와 군대도 가봤다. ‘정치인은 싸움꾼’으로 알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다음주엔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다.
취학전 아이들에게 종일반으로 운영되는 꾸러기학교는 92년 4월 사랑방교회 안에서 만들어졌다. 처음부터 대안교육을 염두에 뒀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라줬으면”하는 소박한 바람에서 출발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사는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었다.
처음 학부모의 눈엔 아이들이 그저 노는 것처럼 비쳐졌다 . 한글이나 산수를 가르치는 시간도 따로 없었다. 아이가 책을 읽고 있으면, 교사가 곁에 다가가 자연스레 함께 책을 읽으며 가르치는 식이었다. 불만이 쌓여갔고, 일부 학부모들은 다른 유치원을 찾아 떠났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어머니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었다. 포천ㆍ원당 등 먼곳에서 아이들을 보내는 엄마도 있다.
15명의 아이들은 월 화 목 금요일 등 1주일에 4번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함께 지낸다. 강사5명이 요일마다 음악, 미술, 과학, 영어, 종이접기 놀이등 재능교육을 맡는다. 그순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아이들의 의견이 먼접니다. 부모나 교사는 나중이예요.” 3명의 교사 가운데 한명인 홍원숙(33)씨의 말이다.
경쾌한 ‘코끼리 행진곡’이 수업시작을 알리면, 아이들이 한 곳에 모인다. 수업이라고 해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게 아니다. 음악에 맞는 율동을 아이들 스스로 만들도록 도와준다. 무엇을 그리라고 지시하지도 않는다. 재료를 주고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게 할 뿐이다. 아이들의 상상력은 끝이 없다. 풍선을 든 도깨비 배속에 꽃을 그린 아이도 있다. 봄바람에 날린 꽃씨가 도깨비 입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놀이를 하고 나면 아이들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는다. ‘몸 굴리기’ ‘인간 피라미드 쌓기’ 등 서로 신체를 맞대는 공동놀이 탓이다. 피라미드 쌓기를 처음할 때 아이들은 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서로 다퉜다. 하지만 곧 나이가 많거나 힘이 센 순서로 피라미드를 쌓는다. 함께 사는 법을 배운 것이다. “아이들의 노는 모습에서 자주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발견합니다. 아이들이 반면 교사인 셈이죠.” 이월영(45) 교장의 말이다.
1달에 1번은 요리를 만든다. 최근엔 김장을 담그기도 했다. “저도 이게 김장담글 줄 알아요.” 리나(7)의 자랑이다. 해마다 여름과 겨울에 열리는 공동체학교는 자연과 호흡하는 시간이다. 지난 12˜5일 강원도 홍천에서 아이들은 눈썰매를 만들어 타고, 연을 만들어 날렸다. 저녁엔 고구마 감자를 구어 먹고, 스스로 대본을 지어 연극도 했다.
꾸러기학교의 공식적인 교육비는 없다. 학교설립 산파구실을 했던 사랑방교회에 헌금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사랑방교회는 학교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오는 4월엔 사랑방교회를 따라 경기도 포천으로 이사한다. 꿈꾸던 운동장도 생긴다. 사정상 제한했던 아이들 수도 2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 인터뷰 / 이월영 교장
엄마 교사역할 두몫 “힘들지만 즐거워요”
교사를 겸하고 있는 이월영(45) 교장은 ‘교장’으로 불리는 것에 익숙지 못하다/ 아이들은 ‘사모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엄마처럼 여기고 따른다.
꾸러기학교는 이씨에게 그 의미가 사뭇 남다르다. 89년 13살 된 아들을 사고로 잃어버린 아픔을 딪고 일어서게 해준 것이 이 학교다. 처음엔 교사가 안되려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씨는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됐다. “꾸러기 학교 아이들 모두가 내 자식이죠.” 사모 노릇을 하랴, 교사 노릇을 하랴, 이씨에겐 이중의 부담이다. 하루종일 아이들과 지내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말할 기운조차 없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지요. 하지만 아침에 아이들이 놀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인천교대를 나와 2년반 교사생활을 했던 이씨가 ”교사 기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며 하는 말이다.
아이들을 데리고 교외로 등산 갔을 때 꾸러기학교에 대한 설명을 들은 한 퇴직교수의 말을 이씨는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선생님 끝까지 힘내세요. 우리 교육이 바뀔 날이 곧 올 겁니다.”
(조준상기자) -한겨레신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