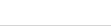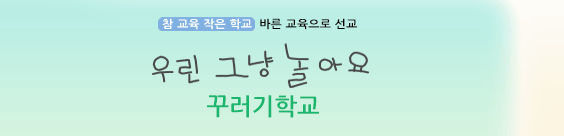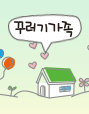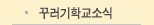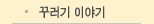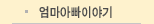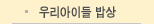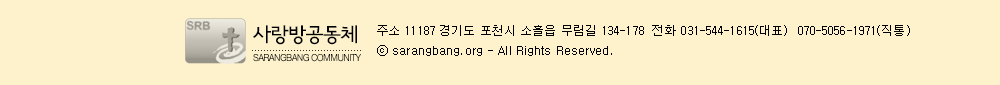내 생애의 아이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종하 작성일03-08-03 03:21 조회1,46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내 생애의 아이들\"이라는 책 제목을 듣는 순간 직업을 속일 순 없는지 \'아! 꼭 읽어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 신청을 해서 요즘 읽고 있는데 정말 괜찮은 책인거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나는 빈센토 쪽으로 흘끗 눈길을 던져보았다. 그의 흐느낌 소리가 좀 뜸해지고 있었다.
얼굴을 거렸던 손을 감히 겉어내지는 못하지만 벌린 손가락들 사이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애를 쓰는 모양인데 필시 사태의 변화에 놀라는 눈치였다.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에 한동안 놀란 그는 넋을 놓은 채 한쪽 손을 자신도 모르게 밑으로 떨어뜨리고 있었다. 슬며시 눈을 던진 그는 자기만 빼고 모두가 다 칠판에 자기 집과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눈물로 부풀고 벌겋게 상기된 얼굴에는 슬픔이 서린 가운데서 자기도 거기에 끼고 싶은 욕구가 감출 수 없게 나타나 있었다.
나는 분필을 손에 들고 그에게 다가가서 타협적인 표정을 지어 보였다.
\"빈센토, 이리 와서 네가 아 빠랑 엄마랑 사는 집을 그려봐,\"
부드러운 긴 속눈썹이 돋은 그의 낭패한 두 눈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적대적인 것도, 믿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닌 그 표정을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갑자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한쪽 발로 서서 마치 용수철에 퉁기듯 다른 한쪽 발을 쑥 내밀었다. 쇠로 된 징이 박힌 구두 끝으로 내 정강이를 정통으로 걷어찬 것이다. 이번에는 아픔을 참지 못해 얼굴을 찡그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빈센토는 아주 만족스러운 모양이었다. 그는 비록 벽에 등을 대고 웅크리고 있었지만 이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듯 대거리를 해오고 있었다. 아마도 내가 주머니 속에 넣어버린 열쇠가 그토록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마음이 아팠다기보다 원한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다.
\"좋아, 너는 필요 없어\"하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아이들을 돌보려고 돌아섰다.
(중간생략)
점심식사 후 나는 우울한 기분으로 학교에 돌아왔다. 모든 것을 또 새로 시작해야 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와 아이가 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오겠지. 또 다시 그들을 서로 떼어놓고 한쪽을 쫒아낸 다음 다른 한쪽과 한바탕 실랑이를 해야겠지. 교사로서의 내 생활이 고달프게만 느껴졌다. 그렇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서둘렀다. 장차 다가올 싸움에 대비해서 단단히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나는 학교 모퉁이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땅바닥에서 몇피트 위로 문턱이 깊은 창문이 하나 있었다. 거기 으슥한 그늘에 아주 조그만 형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하나님 맙소사, 그건 내놓고 나를 공격하려고 온 문제의 자포자기한 꼬마 무법자가 아닌가?
그 조그만 형체가 숨어 있던 곳 밖으로 머리를 약간 내밀었다 틀림없는 빈센토였다. 반짝이는 그의 두 눈이 불타는 듯한 강도의 시선으로 나를 감쌌다. 무엇을 회책하는 것일까? 더 이상 생각해볼 사이가 없었다. 그가 펄쩍 뛰어내린것이다.
그는 로빈슨 크루소의 발 아래 없드린 프라이데이처럼 내 발밑에 엎드렸다. 그리고는 마치 고양이가 나무에 기어오릇이 무릎으로 내 허리와 몸통을 차례로 감고 툭툭 밀며 내게로 기어 올라왔다. 목에까지 이르자 그는 숨이 막힐 정도로 나를 꼭 껴안았다. 그는 내 얼굴에 온통 마늘과 라비올리와 감초 냄새가 마구 풍기는 축축한 키스를 정신없이 퍼부어대기 시작했다. 내 뺨은 그의 침으로 뒤덮였다. 숨이 컥컥 막혀서 \"자, 그만해, 빈센토...\"하고 애원해보아야 소용없었다. 그토록 조그만 아이치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힘으로 그는 나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내 귀에다가 절망의 절규라고만 여겨지는 말의 소용돌이를 이탈리아말로 쏟아붓는 것이었다.
그가 나를 놓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내 쪽에서 그를 꼭 껴안고 등을 정답게 토닥거려주면서, 내가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듯이 그 역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지만 애정이 서린 어조로 그에게 말을 하면서 차츰차츰 그를 진정 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이제는 나를 잃어버리면 어쩌나하는 가슴 찢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그를 안심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중간 생략)
그는 나를 억지로 내 책상이 있는 쪽으로 이끌어간 다음 거기서 가장 가까운 책상 하나를 골라 앉더니 거기에 팔을 고이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 마치 두 눈으로 나를 삼킬 듯이 쳐다 보았다.
나는 빈센토 쪽으로 흘끗 눈길을 던져보았다. 그의 흐느낌 소리가 좀 뜸해지고 있었다.
얼굴을 거렸던 손을 감히 겉어내지는 못하지만 벌린 손가락들 사이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애를 쓰는 모양인데 필시 사태의 변화에 놀라는 눈치였다.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에 한동안 놀란 그는 넋을 놓은 채 한쪽 손을 자신도 모르게 밑으로 떨어뜨리고 있었다. 슬며시 눈을 던진 그는 자기만 빼고 모두가 다 칠판에 자기 집과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눈물로 부풀고 벌겋게 상기된 얼굴에는 슬픔이 서린 가운데서 자기도 거기에 끼고 싶은 욕구가 감출 수 없게 나타나 있었다.
나는 분필을 손에 들고 그에게 다가가서 타협적인 표정을 지어 보였다.
\"빈센토, 이리 와서 네가 아 빠랑 엄마랑 사는 집을 그려봐,\"
부드러운 긴 속눈썹이 돋은 그의 낭패한 두 눈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적대적인 것도, 믿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닌 그 표정을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갑자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한쪽 발로 서서 마치 용수철에 퉁기듯 다른 한쪽 발을 쑥 내밀었다. 쇠로 된 징이 박힌 구두 끝으로 내 정강이를 정통으로 걷어찬 것이다. 이번에는 아픔을 참지 못해 얼굴을 찡그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빈센토는 아주 만족스러운 모양이었다. 그는 비록 벽에 등을 대고 웅크리고 있었지만 이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듯 대거리를 해오고 있었다. 아마도 내가 주머니 속에 넣어버린 열쇠가 그토록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마음이 아팠다기보다 원한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다.
\"좋아, 너는 필요 없어\"하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아이들을 돌보려고 돌아섰다.
(중간생략)
점심식사 후 나는 우울한 기분으로 학교에 돌아왔다. 모든 것을 또 새로 시작해야 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와 아이가 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오겠지. 또 다시 그들을 서로 떼어놓고 한쪽을 쫒아낸 다음 다른 한쪽과 한바탕 실랑이를 해야겠지. 교사로서의 내 생활이 고달프게만 느껴졌다. 그렇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서둘렀다. 장차 다가올 싸움에 대비해서 단단히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나는 학교 모퉁이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땅바닥에서 몇피트 위로 문턱이 깊은 창문이 하나 있었다. 거기 으슥한 그늘에 아주 조그만 형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하나님 맙소사, 그건 내놓고 나를 공격하려고 온 문제의 자포자기한 꼬마 무법자가 아닌가?
그 조그만 형체가 숨어 있던 곳 밖으로 머리를 약간 내밀었다 틀림없는 빈센토였다. 반짝이는 그의 두 눈이 불타는 듯한 강도의 시선으로 나를 감쌌다. 무엇을 회책하는 것일까? 더 이상 생각해볼 사이가 없었다. 그가 펄쩍 뛰어내린것이다.
그는 로빈슨 크루소의 발 아래 없드린 프라이데이처럼 내 발밑에 엎드렸다. 그리고는 마치 고양이가 나무에 기어오릇이 무릎으로 내 허리와 몸통을 차례로 감고 툭툭 밀며 내게로 기어 올라왔다. 목에까지 이르자 그는 숨이 막힐 정도로 나를 꼭 껴안았다. 그는 내 얼굴에 온통 마늘과 라비올리와 감초 냄새가 마구 풍기는 축축한 키스를 정신없이 퍼부어대기 시작했다. 내 뺨은 그의 침으로 뒤덮였다. 숨이 컥컥 막혀서 \"자, 그만해, 빈센토...\"하고 애원해보아야 소용없었다. 그토록 조그만 아이치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힘으로 그는 나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내 귀에다가 절망의 절규라고만 여겨지는 말의 소용돌이를 이탈리아말로 쏟아붓는 것이었다.
그가 나를 놓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내 쪽에서 그를 꼭 껴안고 등을 정답게 토닥거려주면서, 내가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듯이 그 역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지만 애정이 서린 어조로 그에게 말을 하면서 차츰차츰 그를 진정 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이제는 나를 잃어버리면 어쩌나하는 가슴 찢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그를 안심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중간 생략)
그는 나를 억지로 내 책상이 있는 쪽으로 이끌어간 다음 거기서 가장 가까운 책상 하나를 골라 앉더니 거기에 팔을 고이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 마치 두 눈으로 나를 삼킬 듯이 쳐다 보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